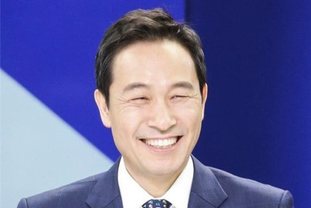삼사사(三司使)란 재정(財政)을 주관하는 염철사(鹽鐵司), 탁지사(度支司), 호부사(戶部司)를 가리킨다.
염철사는 공상수입과 병기제조를 관장하고, 탁지사는 재정수입과 조운(漕運)을 관장하며, 호부사는 호구, 부과세, 정부의 전매(專賣) 등 사무를 관장했다. 삼사사의 책임자는 ‘숫자를 따지는 재상’이란 뜻으로 ‘계상(計相)’이라 불렀는데, 실제로는 당나라의 상서성(尙書省)에 해당하고 지위는 추밀사나 동중서문하평장사보다 낮아 중앙 정령(政令)을 반포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것은 상호간에 견제하고, 직무분장이 뚜렷하지 못했던 수당(隋唐)시기의 삼성제(三省制)에 비해 훨씬 향상된 조치였다. 그 결과 업무의 분장과 직책이 분명해지고 관리체계가 질서 있게 구축됨으로써, 송나라는 오대십국의 난세 속에서 우뚝 일어설 수 있었다.
2. 중앙행정기능 개편: 실권자와 감독자 간 상호견제시스템
송태조 조광윤의 관리임명 원칙은 ‘관(官)’과 ‘직(職)’을 달리하고 ‘명(名)’과 ‘실(實)’을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관리(官吏)제도를 관(官), 직(職), 임명(任命) 등 3종으로 나눴는데 ‘관(官)’은 다만 ‘우녹질(寓祿秩)’, ‘서위품(序位品)’이며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권한은 없었다. ‘직(職)’이란 전각학사(殿閣學士)와 같은 ‘직(職)’을 일부 공로나 명망이 있는 고위관리에게 부여하고, 일부 문학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조정에 끌어들여 고위관리로 육성하였다.
위의 세 가지 관리제도에서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실제 권한이 있는 것이다. 어디에 파견되면 곧 그 곳의 최고책임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권지(權知)라는 직무는 ‘임명하는 것’이다. 임명은 관리의 실제적인 직무로서 중앙이 조정의 관리를 지방장관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중앙기구의 대(臺), 성(省), 사(寺), 감(監), 원(院)에는 담당직책이 없으며, 관리들은 임명 또는 파견되는 명의를 가지고 안팎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관직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직권분리와 유명무실한 임관체제는 누구나 막론하고 권한, 영예, 명망을 한 몸에 지니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도 유념해서 본받을만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원리를 원용하여 국회의원이 장관직이나 대통령수석비서관 직까지 겸임하고 있는데, 이는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다.
왜냐하면 나라에 뛰어난 인재가 많으나 특정한 정치집단이 독점하여 국가인력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 권한이나 권력이 집중될 경우의 병폐인 부정부패가 돋아날 개연성마저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