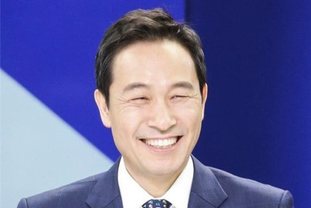그러나 오대(五代)에 들어와 후당을 세운 장종이 후량을 멸한 후 각지의 번진들과 대규모의 혈전을 거치는 바람에 각지의 지방군대는 병력이 쇠퇴되어 중앙군과 대항하기 어렵게 되었고, 정국을 좌우하는 자는 중앙의 금군으로 변했고, 금군의 장군은 정권의 향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다.
오대(五代) 이래 각 왕조의 흥망성쇠는 거의 금군 장군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후주의 태조 곽위를 황제에 등극시키는 계획을 주도한 것도 모두 금군 장군들이었다. 진교병변에서 조광윤에게 황포(黃袍)를 입힌 것도 금군이 획책한 훌륭한 작품이었다. 금군이 나라의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은 조광윤도 벌써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황제로서 금군이 없어서는 안 되며, 한 나라에 군대가 없다면 그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군대를 황제 자신의 수중에 굳건히 장악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오대(五代)시기 후주의 금군은 전전사, 시위친군마군사, 시위친군보군사의 3개 기구로 나뉘어졌다. 이 삼사(三司)는 각기 총사령관인 도지휘사(都指揮使)를 두고 소관(所管) 금군을 지휘했다. 황제가 출정할 때면 임시로 도점검(都點檢)을 임명했는데, 이 도점검은 도지휘사 위에 군림한 금군의 삼사통합 통솔자로서 최고 군사지도자였다. 조광윤이 황제로 옹립된 것도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전전도점검(殿前都點檢)의 권력 덕분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거해 정권을 튼튼히 하고 더 이상 군대가 정치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광윤은 의도적으로 고위직을 비워 놓았고, 사실상 황제가 친히 겸임하는 것으로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황제야말로 군대의 최고통솔자라는 이미지를 조용히 인식시켰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사조치로 금군을 장악한 그에게는 이제 제도적으로 군대를 통제해야 한다는 과제가 대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