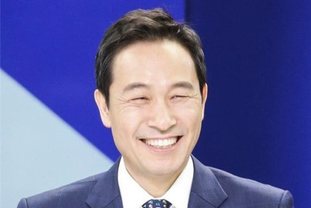시사1 윤여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보호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시설을 옮겨 다닌 아동의 보호이력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양기관에서의 총 보호기간이 기준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보호기간 24개월 미만 아동이 2,44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316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성평등가족부는 24개월 미만 청소년은 12,517명이고, 보호기간 12개월 미만인 아동은 12,233명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또는 청소년)이 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두 기관의 지급기준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각 기관 소관 보호시설에서 2년(24개월) 이상 보호받은 아동(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양 부처에 자립수당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한 아동(또는 청소년)이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쉼터에 나눠서 24개월 미만씩 보호받는 경우, 총 보호기간이 24개월이 넘더라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두 기관에서 각각 24개월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중복으로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연계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월에도 시스템 연계 협의 관련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부처·기관을 늘렸지만, 역설적으로 아동을 소외시킬 수 있는 사각지대도 함께 만든 것”이라 비판하며, “정책도 모르는 아동이 부처를 가려가며 보호받지 않는 만큼, 양 부처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즉시 연계하여, 부처의 칸막이가 아이들의 자립을 막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