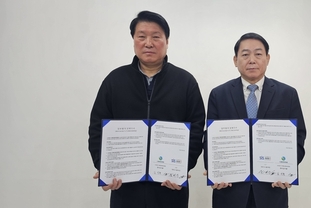2. 배주석절권(杯酒釋節權): ‘한 잔의 술’로 절도사직 박탈
황권과 관련된 중대문제에 관해서는 황제의 자질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이 각기 달랐다.
절도사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문제를 처리할 때, 조광윤은 넓은 아량과 진정어린 마음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명백히 언급했다.
968년(태조9) 10월, 조광윤은 후원에서 연회를 열고 후주 때부터 절도사직을 오래 역임한 몇 명의 번진 절도사들을 초대했다. 이 연회에 참석한 절도사는 봉상(鳳翔)절도사 왕언초(王彦超), 안원군(安遠軍)절도사 무행덕(武行德), 호국군(護國軍)절도사 곽종의(郭從義), 정국군(定國軍)절도사 백중빈(白重贇), 보대군(保大軍)절도사 양정장(楊廷璋) 등이었다. 이들은 후주시기부터 송나라에 걸쳐 계속 나라를 위해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서로 기뻐했고 옛날의 공적과 노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얕은 수를 피울 줄 모르고 일을 졸렬하게 처리하지 않는 조광윤은 태연자약하게 그리고 솔직히 말했다.
「여러 분들의 이야기는 다 지나간 옛일들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경(卿)들은 모두 나라의 원로들이고 오랫동안 번진에 있었습니다. 과다한 공무를 처리하느라 고생시키는 것은 여러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조정에 돌아와 유유자적한 복록을 누렸어야 했습니다.」
조정에 돌아온다는 것은 실권이 없어지고 황제로 하여금 안심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번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민감했다. 군을 거느리면서 스스로 위세를 부린다든가 독립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왕언초(王彦超)가 얼른 좌석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신(臣)은 작은 공로를 세웠다고 분에 넘치는 영광과 폐하의 은총을 누려왔습니다. 이제 노쇠했는데 다행히 복록을 누릴 기회를 주시니 전원생활로 돌아가도록 하겠나이다.」
다른 절도사들도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좌석에서 나와 무릎을 꿇고 노령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줄 것을 청했다. 조광윤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한 사람씩 일으켜 세우면서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연회가 끝난 후 다섯 절도사들은 모두 사직서를 냈다. 송태조 조광윤은 그들의 절도사직을 해제하고 조정에서 ‘태자태부(太子太傅)’, ‘좌금오위상장군(左金五衛上將軍)’ 등 명예의 성격을 띤 한직(閒職)을 맡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