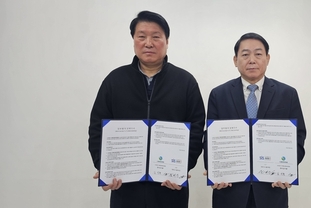불과 53년 동안 왕조가 다섯 번이나 바뀌고 14명의 황제가 명멸했던 오대시기에는 무인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정치사회였다. 이처럼 무인들이 각지에서 황제를 칭할 수 있는 분위기는 누구라도 군대의 힘만 있으면 한 지역을 차지하고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을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생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다.
그는 중앙의 금군을 강화해 지방군이 감히 중앙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도 용맹을 갖춘 강력한 황제가 살아 있을 때나 유효할 뿐, 겨우 일곱 살인 어린 황제의 능력으로는 소용이 없었다. 세종이 죽고 세상물정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즉위했으니 과연 누가 천하를 제패하겠는가? 당시 전전도점검으로 있으면서 금군을 장악하고 있던 조광윤이 사실상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손쉽게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그는 세종이 타계하고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황제자리를 찬탈하려 하지 않고 새로 맡은 귀덕(歸德)절도사의 직책을 수행하러 의연하게 귀덕부(歸德府)로 떠났다. 이러한 행동은 여간 인덕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흉내 내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귀덕절도사의 직책을 맡을 때 조광윤은 전전도점검과 검교태위를 겸하고 있었다. 귀덕절도사에 부임한 후, 어느새 반년을 훌쩍 넘겼다. 신년 정초가 되어 군에 변고가 생겨서야 변경(汴京)에 들어가서 군사를 거느리게 되었다.
세 명의 재상 가운데 범질을 제외한 두 사람이 조광윤을 황제로 옹립하려 했다. 왕부는 평소 조광윤과 진심으로 교제하며 흉금을 털어놓을 정도로 마음이 통했다. 또 재상 위인포는 조광윤과 대대로 교분이 있는 사이이며, 특히 그의 아들 위함신(魏咸信)과 조광윤의 셋째딸 영경공주(永慶公主)는 어려서부터 정혼을 약속할 정도로 두 집안이 친했다.
군부에서 전전부도점검인 모용연소(慕容延钊)는 평소 조광윤을 친동생처럼 아끼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전전도우후 왕심기(王審琦)와 전전도지휘사 석수신(石守信)은 의사십형제 중의 한 사람이다. 시위마군도지휘사 고회덕(高懷德), 시위보군도지휘사 장영탁(張令鐸), 시위마보군도우후 한영곤(韓令坤) 등 여러 고위장군들은 모두 조광윤의 친구들이었다.
그의 세력이 후주의 군정(軍政) 계통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조광윤을 황제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은 역사서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인 것이다. 나라 밖에는 세종에게 땅을 빼앗긴 남당왕 이경이 호시탐탐 복수하려 하고 전쟁에서 패한 치욕을 씻으려 했다. 그러나 세종이 죽은 후 아무런 보복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후주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조광윤이 두려워서였다.
북한 역시 고평전투를 거쳐 조광윤의 용맹함을 잘 알고 있었고, 또 후주 황제가 어리고 나라가 어수선하여 조광윤이 필히 군권을 이용해 권력을 잡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었다. 후주의 경성(京城)에서도 조광윤을 옹립하려는 것이 민심의 향배였다. 경성의 백성들은 크게 걱정했다. 황제에 즉위한 시종훈은 너무 어렸고 황급히 황후에 책봉된 태후 부씨(符氏) 또한 황제의 생모가 아니었다. 변경성 안의 백성들은 거란을 제일 미워했다. 그들은 아직도 거란인들이 947년 후진을 멸망시킬 때 변경성 밖에서 저지른 만행을 잊지 않고 있다.
세종이 타계했으니 누가 북벌(北伐)의 대업을 이어간단 말인가? 어린 황제와 태후에 의지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성에는 또 “점검(點檢)이 황제가 된다.”는 말이 파다하게 떠돌았다. 거란을 정벌하다가 중도에 돌아온 세종이 사방에서 온 문서를 읽어보다가 3척 길이의 목패(木牌)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점검이 황제가 된다(點檢做天子).”라고 쓰여 있었다. 세종은 당시 전전도점검이었던 장영덕이 황위를 노리고 있다고 의심해 그를 파직시키고 조광윤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 그 당시 이 일은 경성에 널리 퍼져있었다.
군대 사정, 나라 안팎의 사정, 민심이 다 조광윤이 후주의 앞날을 위해 새로운 황제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이와 같은 시대적 열망을 뒤로 하고 그냥 귀덕절도사로 훌쩍 떠났다. 그 것은 조광윤의 세종에 대한 두터운 충성심과 신의를 엿보게 하는 대목일 뿐만 아니라, 정치판은 마치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커질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지도자의 탄생은 다른 사람의 천거나 옹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덕을 쌓아 가는데서 이루어진다. 세종이 6월에 타계하고 7월에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광윤이 귀덕부로 가서 절도사에 부임함으로써 일단 이런저런 소문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조광윤이 경성을 떠나자 “점검(點檢)이 황제가 된다.”는 떠들썩했던 소문도 금방 잠잠해졌다. 사방이 무사하자 후주는 안정을 되찾았다. 조광윤이 마치 정치의 중심에서 멀리 떠난 것 같아 경성 사람들은 그를 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