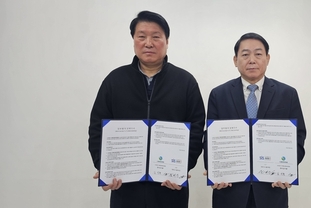5.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수주성(壽州城) 함락
세종은 육합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조광윤을 전전도지휘사 겸 광국군(匡國軍)절도사로 승진시켰다. 이로부터 조광윤은 대장군 반열에 들게 되어 군사적 지위가 확고하게 되었으며, 조정의 중신이 되었다.
조광윤과 같은 명장이 있었지만, 회남에서 장기전을 벌여온 후주군은 지치고 군량과 마초의 공급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자 세종은 전쟁에 염증을 느꼈다. 그리하여 세종은 회남절도사 향훈(向訓)에게 양주를 지키고, 이중진에게 계속 수주를 공격하도록 명하고는 조광윤을 비롯한 나머지 대군을 이끌고 변경(汴京)으로 돌아갔다. 이때를 틈탄 남당왕 이경은 이경달을 시켜 병력을 보완하고 국력을 한데 모아 후주군에 반공을 가했다.
세종이 이미 대군을 거느리고 본 국으로 돌아갔고 후주군 전력(戰力)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남당왕은 잃었던 많은 땅을 되찾게 되었다. 양주를 지키고 있던 회남절도사 향훈은 오래 지탱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자, 세종에게 양주에서 철수해 전력 수주를 공략할 것을 건의했다. 세종이 이에 동의하여 향훈이 양주에서 철수하자 후주군은 모두 수주성 밑에 집결했다. 남당의 충신 유인첨이 수주를 사수하자 후주군은 오랫동안 공략할 수가 없었다. 양군이 허구한 날 수주성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상황은 점점 후주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대다수 장군들은 수주성이 견고하고 남당지원군 또한 강대하기 때문에 철군할 것을 요청했지만 세종은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때 후주의 노장 이곡(李谷)은 집에서 병치레를 하고 있었다. 957년 2월 8일, 세종이 재상 범질(范質)을 보내 회남에서의 철수여부에 대해 이곡과 상의하도록 했다. 이에 이곡이 상서를 올렸다.
「수주는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친정하신다면 장병들이 앞 다투어 용감하게 싸울 것입니다. 남당지원군은 필히 겁을 먹게 되고 수주는 반드시 공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세종의 뜻과 같았다.
이해 2월 16일 세종은 2차 회남출정을 개시했고 이번에도 전전도지휘사 조광윤이 수행했다. 세종은 3월 2일 밤에 회수를 건너 수주성 밑에 접근했다. 이튿날 아침에 그는 다시 부대를 옮겨 자금산(紫金山) 남쪽에 주둔시켰다. 세종은 조광윤에게 남당의 선봉군영과 산 북쪽의 군영을 공격하도록 명을 내렸다. 출격명령을 받은 조광윤은 맹수처럼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조광윤은 반나절도 채 안되어 남당의 두 군영을 격파하고 3천여 명의 수급을 베었다. 그리고는 남당지원군이 구축한 수주성으로 통하는 군량수송로를 차단해 수주성에 대한 철통같은 포위망을 펼쳤다. 남당군부대는 머리와 꼬리가 끊겨 수주성은 졸지에 고립무원한 성이 되고 말았다.
그날 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당의 초토사 주원(朱元)이 1만 여명 군사를 이끌고 후주에 항복했다. 이로 인해 남당군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하늘이 준 기회였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세종은 전면공격을 개시해 남당군을 대패시키고 주장(主將) 변호(邊鎬)와 허문진(許文稹)을 생포했다. 남당 잔여부대는 회하를 따라 배를 타고 패주했다.
세종과 조광윤은 수백 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회하북안에서 추격하고, 다른 부대는 회하남안에서 추격했으며, 후주수군도 회하물살을 타고 협공했다. 남북 양안과 수로에서 남당 패잔병이 전사하고 익사하고 항복한 자가 4만 명에 달했고 노획한 함대, 양식, 병기 등은 십만을 헤아렸다. 수주를 지원하러 온 남당부대는 전멸했다.
수주의 주장 유인첨은 지원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몸져 드러눕게 되었다. 수주성은 일시에 군무를 수행하는 지휘관이 없어진 것이다. 유인첨의 병세는 더욱 깊어져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957년 3월 19일, 남당의 감군사(監軍使) 주정구(周廷構), 영전부사(營田副使) 손우(孫羽) 등은 유인첨의 명의로 상주(上奏)문서를 기초하고 성 밖에 나가 항복했다. 세종은 유인첨에게 조서를 내리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수주를 탈취한 후주는 다시 회남 전역(全域)에 대한 출정을 개시했다. 조광윤은 난공불락의 성 수주성 함락에 가장 큰 공을 세워 검교태보(檢校太保)가 되어 의성군(義成軍)절도사와 전전도지휘사를 계속 겸하게 되었다. 이때 조광윤은 겨우 31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