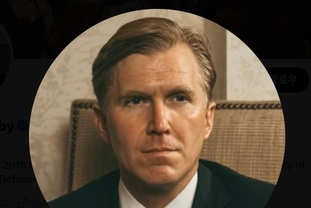고평전투에서 유감없이 보여주었듯이, 조광윤은 전쟁터에서 작전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하를 다스리는 통솔능력도 있었다. 그는 군대는 반드시 행동이 일치하고 규율이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평전투에서 후주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자 조정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을 감행했던 세종의 위신은 크게 올라갔고 조광윤의 지위도 견고해졌다.
그러나 고평전투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켰다. 첫째는 노장 번애능과 하휘가 적군의 기세에 눌려 군사를 끌고 도주하는 바람에 전군(全軍)이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었다. 둘째는 군기가 문란하고 북한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는가 하면 잔학한 짓을 했던 점이었다. 고평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세종은 승세를 타고 북한의 수도 태원을 공격하도록 명했다. 당시 형세로는 후주가 아주 유리했다. 세종이 대군을 이끌고 도성 태원성을 겹겹이 포위하자 그 기세에 눌려 북한의 각 주현(州縣)이 분분히 항복했다. 그러나 군량공급이 끊기자 많은 후주병사들이 당장 급한 군량문제를 해결하려고 북한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는 바람에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항복했던 북한의 주현들도 다시 태도를 바꿔 후주군에 대항했다. 태원성을 함락시키려던 세종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그는 부득이 군사를 이끌고 변경(汴京)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셋째는 대대로 군 생활을 해온 병사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검열을 하지 않아 노병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적병을 만나면 도망가거나 항복하기가 일쑤였다. 고평전투 후 군대에 상존하는 병폐를 깨닫게 된 세종은 후주군을 일제 정비해 정예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번애능 등을 죽임으로써 군기를 잡으려 했으나 노장들에게 차마 칼을 빼들 수 없었다. 어느 날 세종이 행궁 천막 속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전전도지휘사 장영덕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고민하던 세종이 장영덕에 물었다.
「번애능, 하휘 등을 죽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에 장영덕이 아뢰었다.
「그들은 평소 공을 세운 적이 없고 장수직(將帥職)만 차지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적을 만나 먼저 도망쳤으니 죽어도 그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사해(四海)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려는 폐하께서 만일 군법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용맹한 백만대군을 가지고 있은들 폐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에 흥분한 세종 시영은 기대고 있던 목침을 땅바닥에 내던지며 지당한 말이라고 했다. 그는 즉시 번애능, 하휘와 군리(軍吏) 이상의 군관 70여명을 체포해 그들을 문책했다.
「역대의 노장이란 작자들이 어찌 싸울 줄 모르겠는가? 적군이 오자마자 줄행랑친 것은 다름 아니라 짐(朕)을 귀한 물건으로 삼아 유숭에게 팔아치우려 한 것이니라!」
그는 즉시 그들을 모두 참수했다.
이전에 진주(晋州)를 수호할 때 공을 세웠던 하휘에 대해서는 사면(赦免)하려 했으나, 군법을 어길 수 없다고 생각한 세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수하고 관(棺)을 하사해 고향땅에 안장하도록 했다. 이로써 교만하고 횡포했던 장령들과 나태했던 병사들이 군법의 존엄성을 알게 되었고, 조정의 간신배들에게 빌붙었던 장령들도 더 이상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