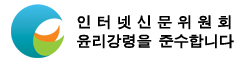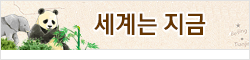(시사1 = 김재필 기자)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하략-
소설 <상록수>의 저자로 유명한 일제 강점기의 시인 심훈이 광복의 그 날을 갈망하며 부르짖었던 시 ‘그 날이 오면’중 첫 연이다.
위 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바우라 교수가 전 세계의 저항시를 다 모아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으뜸으로 꼽았다.
여기서 삼각산(三角山)은 북한산의 별칭으로 백운대, 인수봉, 만경봉의 세 봉우리가 있어서 불리게 된 이름이다.
북한산에는 보물로 지정 된 2기의 마애불이 있다. 진관동 ‘삼천사’에 있는 마애여래입상(보물 제657호)과 구기동 '승가사'에 있는 마애석가여래 좌상(보물 215호)으로 모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마애불로써 크기나 조각 솜씨가 비슷하다.
위 시를 읽고 나는 고려 때부터 우리 민중과 함께 했던 이 2기의 마애불도 광복을 맞았을 때 춤을 추었으라고 생각한다.
통일신라시대인 서기 661년 원효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고찰 삼천사(三川寺)는 ‘동국여지승람’’과 ‘북한지’에 따르면 삼천여명의 대중이 수행 장소로 사용할 만큼 웅장한 규모를 자랑했다고 한다. 이덕무가 쓴 <기유북한(記遊北漢)>에서도 고려시대 3000여 스님이 살아 삼천사 인근 계곡을 삼천승동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삼천사라는 사찰 이름도 삼천여명의 대중이 수행정진을 했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하나 마애불 소개 안내문의 한문표기는 ‘三川寺址’로 표기 되어 있다.
실제로 <고려사>와 (신증 동국여지승람>이나 ’삼천사 대지국사비(大智國師碑)의 비편(碑片)에도 ‘川’로 표기 되어 있는 걸 보면 북한산에 많은 계곡을 의미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럼 삼천사의 이름이 바뀐 건 언제일까? 조선시대인 1711년 북한산성을 축조할 때 산성에 대한 자료인 <북한지(팔도도총섭이라는 직책의 성능스님 지음)>에 ‘三千寺’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걸로 보아 18세기 이후부터 ‘三川寺’가 ‘三千寺‘로 개명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한편 삼천사는 서기1592년(조선 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승병들의 집결지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임란 중에 소실 되어 400여년동안 폐사로 남아 있다가 뒷날 이 절의 암자가 있던 마애여래입상 길상터에 진영 화상이 삼천사(三千寺)라 하여 다시 복원하였다. 허나 이 암자도 6.25전쟁으로 불에타 다시 폐사되었다.
그후 1978년에 서울로 올라 온 성운 스님(주지)은 북한산 진관동 토굴(현 보덕사)에서 정진 중인 혜안 스님을 만났다. 포행 삼아 산에 오르다가 전각 옆 마애불을 만났다. 전에 오대산 적멸보궁에서 200일 기도 회향 10여일전쯤에 꿈속에서 보았던 그 마애불이다.
“아, 내가 머물 곳은 여기다!”
하며 마애불 밑에 터를 닦아 50여년의 불사를 통해 법당, 요사채 등 30여동을 건립해 지금은 연간 20만명이 참배하는 큰 가람으로 중흥 되어 삼천사 1,400여년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또한 마애불도 정밀조사를 통해 미술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마애불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 5월 22일에 보물 제657호로 지정 되었다.
은평 한옥마을을 지나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길에 삼천사 경내로 들어서면 대웅전 뒤편 우측으로는 등산로로 이어지고 좌측으로는 마애불이 새겨진 병풍바위와 산령각(山靈閣)으로 통하는 길이다.
원래의 삼천사는 고려시대에 법상종(法相宗)의 사찰로써 이 곳에서 위쪽으로 도보로 30여분 거리에 위치 해 있었으며 그 곳에서 발굴 조사로 발견된 대형 석조(石槽)와 동종(銅鐘), 연화대좌(蓮花臺座), 석탑기단석(石塔基壇石), 석종형부도(石鐘形浮屠), 대지국사(大知國師) 법경(法鏡)의 비명(碑銘)등 600여점의 문화재가 발굴되었고. 그 중 동종은 보물로 지정받아 현재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좌측길인 산령각으로 가는 길에 들어서니 바로 옆 높이 3.2미터의 화강암인 커다란 병풍바위에 2.6미터 크기로 얕개 돋을새김으로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머리위에는 묵직한 바위가 차양처럼 얹혀져 있으며 또한 병풍바위 위엔 빗물이 조각상 바위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상단에 물골을 만들어 보호하였기에 천년여년의 세월을 비켜올 수 있어 비교적 섬세한 새김의 윤곽이 마모됨이 없어 선명한 마애불이 불자들의 참배를 받으며 가없이 자애로운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머리는 소발로, 민머리에 육계를 높이 올린 모습이다. 눈썹과 턱선은 둥그러워 원만해 보이고 눈썹 사이에는 백호가 있고, 아래를 향해 살짝 뜬 눈은 가로로 길게 선으로 표현돼 지긋하게 감은 것처럼 보이고, 목의 삼도는 뚜렷하며 살짝 다문 입술주위에서 미소가 묻어나온다. 귀는 목까지 길게 내려온 전형적인 부처의 귀로 인해 상호 전체적인 표정이 한없이 자애롭다.
이러한 얼굴엔 2중의 원형으로 된 두광이 둥그렇게 감싸고 있다.
양쪽 어깨에 걸친 법의(法衣)의 앞섶은 띠로 도식 되었는데 왼쪽 복부 근처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Y’자 형태로 신체 굴곡이 드러나지 않은 까닭에 법의가 두꺼워 보인다. 팔과 옷 앞자락에는 주름을 새겼는데 양 손에 차이가 있다. 왼손은 겨드랑이부터 팔꿈치까지 주름이 촘촘히 표현돼 있고 손목부분에서는 주름을 잘게 표현해 법의 끝이 겹쳐 아래로 늘어지게 보인다.
반면에 오른팔은 상대적으로 주름 수가 적어 법의가 펴진 모습을 연상시킨다. 안에 입은 내의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사선처리 됐다. 가슴 아래에는 군의를 묶은 매듭이 나비모양으로 표현돼 있으며 끈인 무릎 아래까지 흘러내린다. 양쪽 다리 사이에는 ‘U’자 주름이 새겨져 있다.
왼발은 5개의 발가락을 표현하였는데 오른발은 4개의 발가락만을 표현하여 석공이 깜빡잊었나 보다. 양발은 뒤꿈치를 모아 벌린 모습으로 모든 진리의 탄생처(誕生處)가 된다는 연꽃 대좌위를 딛고 서 있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마애불에선 보기 드물게 안정된 비례감으로 균형이 잘 맞아 사실적으로 친근감 있게 표현되었으며 두광의 아래부분과 맞닿은 신광(身光)이 불신을 감싸고 있어 더욱 우아하게 보인다.
마침 산령각을 비켜 나오는 아침 햇살이 그늘에 가려졌던 얼굴에 가득히 비추니 푸근하고 자애로롭게 참배객을 지긋히 내려보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듯한 표정이 푸근하게 퍼진다.
이 때다. 나는 촬영으로 알게 된 ‘마애불은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는 경험을 토대로 정면을 촬영후 산령각 위에서 부감으로, 대웅전 옆에서 앙각으로 촬영을 해 본다.
그 때마다 마애불은 나에게 최선의 자세를 취해 준다.
대 여섯명의 참배객도 다 떠나고 혼자 남아 2시간 이상을 참배하던 분이 일어난다.
견기불착(遣基不着)
물질이나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모든 걸 내려놓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의 표정이 밝다.
그는 무엇을 내려놓고 가기에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기도를 시작했다가 밝은 표정으로 일어 날 수 있었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마음이 무거울 때 마애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의 지혜의 향기가 온 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