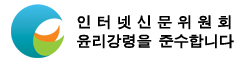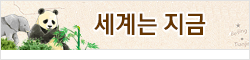(시사1 = 김재필 기자)
黑石寺冬雨 乙巳冬 -흑석사에서의 겨울비, 을사년 겨울-
冬序宜寒反作暄。 겨울이야 마땅히 춥지만 도리어 요란해 지더니
峽天中夜雨飜盆。 골짝 하늘 한밤에 비 내려 화분을 엎었네
憑添一掬憂時淚。 걱정 한 움큼 더해 때때로 눈물을 흘려
寄與前溪到海門。 앞시내에 띄웠더니 바다에 이르렀네.
위 시는 영주 출신의 문인인 김시빈(金始鑌: 1684∼1729)의 『백남선생문집(白南先生文集)』에 나오는 ‘흑석사에서의 겨울비(黑石寺冬雨)’라는 시다.
한 추위가 물러간 1월중순에 ‘안동 이천동 마애여래입상’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안내를 해 주신 지인이 “저 어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자주 다니셨던 절에도 마애불이 있는데 가 보시겠어요?“
어디냐고 물어보니 영주에 있단다. 오후 햇빛이 길게 서산 위에 걸쳐 있어 3시간이상 걸리는 귀가가 바쁜 시간었지만 귀가 솔깃했다. 즉시 진로를 바꿔 영주시내를 지나 국도를 나와 좁은 길로 15분정도 달리니 단아한 절집이 나타난다.
위의 시에서 흑석사(黑石寺)다. 지인의 고향이 안동이니까 교통편이 좋지 않았던 몇 십년전에 그 분의 어머니께선 이 절까지 참배오셨다니 불심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
사찰이름은 대개가 불교의 사상에 맞는 이름이 많은데 ‘흑석사(黑石寺)’라니 이름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명칭이 분명 이 동네에 검은 바위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유래를 알아 보았다.
옛 사람들은 이 동네에 ‘검둥바우’가 있어 ‘검둥골’이라 불렀는데 조선 중기 무렵 군(郡)의 행정구역을 정비할 때 이 곳 선비들이 모여 ‘검둥바우’에서 유래하여 검을 흑(黑)자에 돌 석(石)자를 써 흑석(黑石)이라 칭했다고 한다.
이 마을의 촌노 한 분의 말씀으론 “흑석에는 검은바우가 여럿 있는데 그중 가장 크고 상징적인 바위 모양이 북(모시나 삼 베틀에서 씨줄을 담는 나무속을 파 내어 만든 작은 통)을 닮아 ‘북바우’라 부르기도 하고, ‘거북바위’라 부르기도 했다하나 이 동네의 예전 이름을 따 사찰 이름을 흑석사(黑石寺)로 명명한 것은 언제였지는 숙제로 남겨 놓았다.
흑석사의 창건에 대한 역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부석사를 비롯한 인근의 사찰들처럼 통일신라시대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 후 임진왜란 때 폐사되었는데 소백산 국망봉 아래 초암사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상호 스님은 1950년대 초에 초암사에 봉안되어 있던 목불을 직접 업고 80여리길을 걸어 폐사지인 흑석사터로 옮겨 와서 자그마한 초막을 짓고 절을 새로 열었다. 이 때 업고 온 불상이 국보로 지정된 흑석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다.

이 불상이 국보로 지정된 재미있고 우연한 내력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후반 어느 가을날. 당시 목조아미타불좌상은 열 평쯤 되는 허름한 목조 전각에 모셔져 있었다.
어느 날 부봉 스님이 아침 예불을 드리러 가 보니 상호 큰스님께서 팔십여리 산길을 직접 업고 온 불상이 불상이 안 보인다. 당황한 스님은 즉시 경찰서와 시청에 연락하고 주변을 살폈다.
신고를 받고 달려 온 경찰과 시청 직원들이 주위를 샅샅이 살핀 결과 그 날 오후에 절에서 삼백미터쯤 떨어진 논바닥에 불상과 여러 복장유물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게 발견되었다.
조심스럽게 수습하여 흑석사로 옮겨왔다. 여태까지 누구도 불상의 내부를 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복장유물의 존재를 몰랐는데 도둑이 들어 복장물을 헤집어 놓는 바람에 그 복장에 무엇이 존재했는지를 알게 했다.
이를 수습하여 다시 목불의 복장으로 봉안하기전에 문화재청 관계자와 관련 학자들을 흑석사로 불러 불상과 복장유물을 살폈다. 이건 국보급 수준이었다.
이후 체계적인 연구와 고증,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1993년 11월 5일에 불상과 복장유물이 국보 제282호로 일괄 지정되었으니, 시골의 한 절에 목조상태로 있던 부처는 그 도둑 덕분에 국보로 승진한 부처님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이 불상은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이 1458년 세조의 후원을 받아 만든 삼존불의 본존으로, 조선시대 초기 왕실이 발원한 불상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2016년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은 ‘아미타 신앙’과 극락을 주제로 갖고 아미타여래와 극락세계를 표현한 성보문화재 위주로 기획된 특별전 ‘꿈꾸는 즐거움, 극락(極樂)’을 개최했는데, 나는 박물관에 자원봉사로 근무하는 한 보살(여기서 보살이란 불교 여신도)의 연락을 받고 관람한 적이 있다.
이 때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처음 서울 나들이를 하여 이 곳 전시장 입구 중앙에 단독으로 설치되어 당시 관람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걸로 기억한다.(당시엔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인지 몰랐다.)
내가 찾던 마애삼존불은 대웅전 뒤편에 보호각에 너비3.5m 높이6m의 앞면이 비교적 평평한 바위에 새겨져 있다.
삼존불 앞에는 진홍섭(1918∼2010. 미술사학자) 선생의 「신라북악 태백산 유적 조사보고」에 따르면, 1960년 3월 당시 흑석사를 중건하고 있던 한 노파의 말을 빌어 1953년 현몽을 받아 석불(보물 제681호 흑석사 석조여래좌상)을 발굴하였다는 석조여래좌상이 30여센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좌대에 마애삼존불 앞에 앉아 있어 본존불 가슴아래는 정면에선 안 보인다.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경에 조성되었다는 이 석불은 광배와 좌대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신만 안치한 것인데 지금의 종각 부근에서 발굴했을 때 '광배와 좌대를 제대로 갖추어 별도의 장소에 안치하지 않고 불신만 이 곳에 안치 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고 보니 이 절엔 신라시대의 조성된 석조여래좌 상(보물), 고려시대에 조성된 마애삼존불(지방 유형문화재),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가 시대별, 문화재 등급별로 즉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닌가?
마애삼존불은 모두 입상으로 본존불은 가슴아래부터, 좌우 협시불은 목 아래부터 별다른 새김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러 그랬는지 다른 무슨 연유가 있어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좀 엉성한 도식의 얕은 새김으로 조성되었으며 입술부근에 적색으로 채색한 흔적으로 인해 붉게 보인다.
본존불은 둥근 두광을 지니고, 두상은 정사각으로 머리의 육계가 크고 눈은 아래로 지긋히 감고 있으며 귀는 길게 어깨까지 늘어져 있고, 코와 입등이 간단하게 표현 되었다.
언뚯 보면 없는 것 같은 움츠린 목에는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으며 양 어깨에 걸친 옷의 주름과 수인 역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본존불에 비해 낮게 새긴 협시불은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엉성하게 표현된 둥근 두광에 삼산관을 쓰고 있다. 그 외는 본존과 마찬가지로 세부표현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표현양식으로 시대추정이 어렵지만 나말여초시대에 조성됐다는 걸로 보아 세월에 비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해가 보호각 뒤의 나지막한 산을 넘으니 여여하던 절간이 더욱 스산하게 느껴진다.
곧 법당앞의 장명등이 밝혀질 것이다.
“自燈明 法燈明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
마지막에 남긴 석가모니 부처가 남긴 말이 떠 오른다..
돌아오는 고속도로엔 많은 차들이 불을 밝힌 채 질주하고 있다.
도로를 달릴 때 전조등을 밝히듯 나는 지금까지 자등(自燈)과 법등(法燈. 여기서 법등은 부처의 말에만 한하지 않는 모든 진리가 아닐까)을 밝히고 걸어 왔는지 자문하면서 다시 운전대를 고쳐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