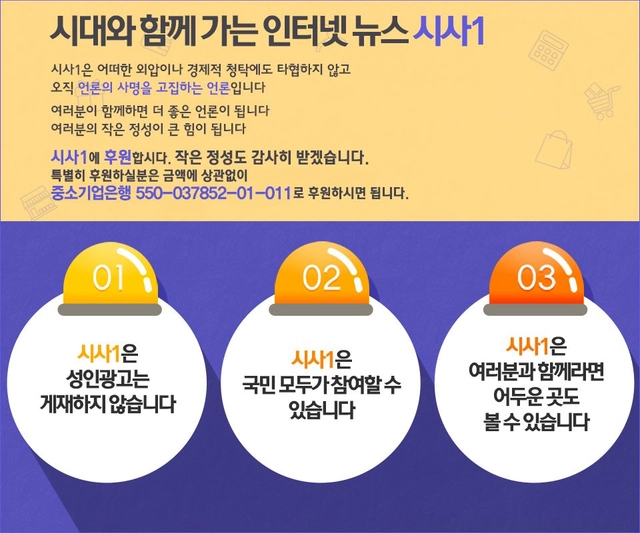서울 도심의 사무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급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불경기가 지속되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은 16일, 올해 상반기 전국 사무실 공실률이 13.1%라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공실률은 5.4%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1%로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건물별로 봤을 경우, 중소형 건물은 10%지만 대형건물은 13.1%로 나타났다. 또, 도심권의 사무실 공실률은 12.3%, 강남권이 10.8%, 여의도, 마포권이 9.2%로 임대료가 비쌀수록 공실률이 높아졌다.
지방의 공실률은 서울보다 심각하다. 부산과 대구의 공실률은 15~16%이고 인천, 광주는 18%, 대전은 21%다. 또, 임대료를 제대로 받기위해 일부러 빈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는 건물도 많아 실제 공실률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빈 사무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임대료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2008년 전국 평균 1㎡당 1만 5천원이었던 임대료는 올해 상반기 1만 4,800원으로 2천원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은 아이러니하게도 1만 8,600원에서 2만 5백원으로 임대료가 올랐다. 대형건물 관리업체들이 공실이 있어도 임대료를 몇 달간 면제해주는 ‘렌트 프리’방식을 이용해 적정 임대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건물들은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사무실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 값의 임대료를 받아도 공실률이 10% 이상이라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2012년 서울의 사무실 임대료는 고점을 찍고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빈 사무실의 증가는 신축 건물의 과잉공급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관리업체 신영에셋은 서울, 분당 지역에 2010년부터 5년간 900만㎡의 사무실이 공급되었다고 밝혔다. 1년에 180만㎡씩 늘어난 것이다. 2001~2009년까지 연평균 83만㎡의 사무실이 공급된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공급된 셈이다.
이러한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상암읓, 판교 제2테크노밸리, 강동첨단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대 사무실도 주택시장처럼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조정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