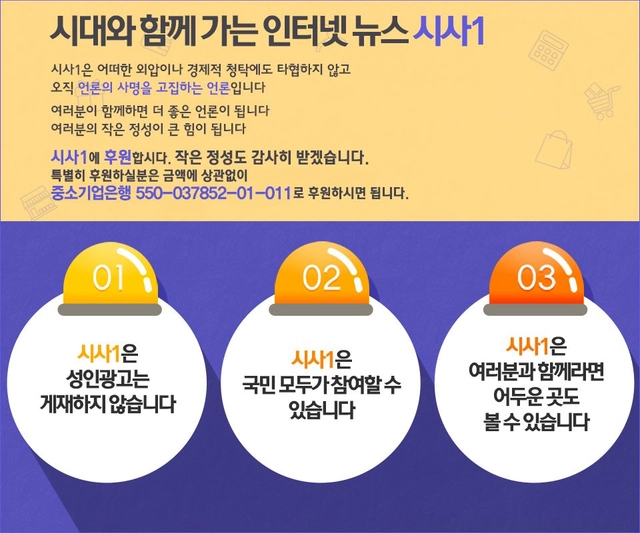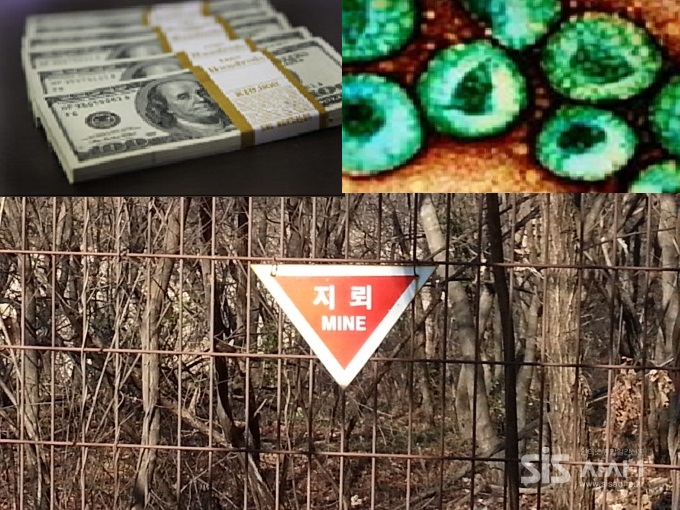
한국 경제의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6월부터 한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극심한 내수 침체에 시달려왔다.
이후 메르스 여파가 가시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던8월에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해 증시 폭락이 이어졌고, 8월20일에는 북한의 포격도발이 이어져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이전에도 금융시장은 북한의 도발에도 차분하게 반응해왔다. 1993년 북한의 노동1호 미사일 발사, 2011년 김정일 사망 등,북한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식시장은 큰 영향을 받아오긴 했지만,금세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미‘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시장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북한과의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금융시장 외의 소비,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의 마찰이 일회성으로 끝나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기엔 넘어야할 장애물이 남아있다.한국 경제의 특성상 내부 요인보다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기침체의 영향은 계속해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당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환율정책까지 쏟아 부으며 경제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아직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중국의 경제 위기는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 인상역시 한국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미국이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설은 힘을 잃었지만,연내에 반드시 인상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기준금리의 인상은 국내 금리의 인상을 유발해 가계대출문제가 터질지도 모른다.
국제 유가의 급락도 마냥 반가운 상황이 아니다.한국은 원유를 수입하는 입장이지만,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수출 비중이 큰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인하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산업의 부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악재들 사이에서 시장이 과도한 불안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합동점검대책반을 만들어 미국과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의 기관들도 별도의 대책회의를 가지고 시장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1차관은“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관계 기관들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