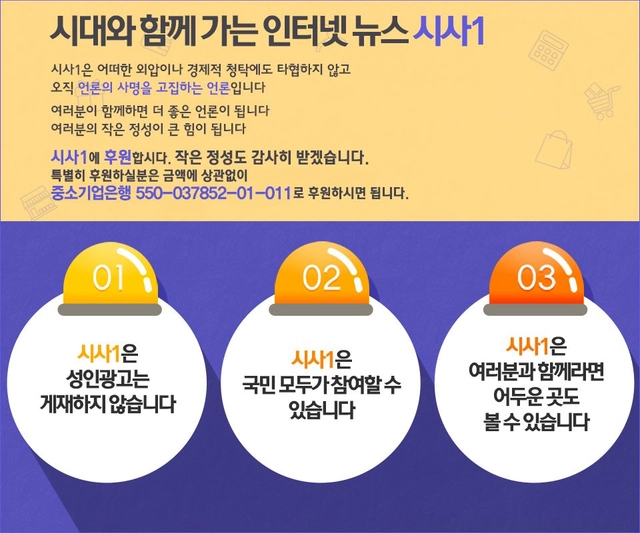윤대진 건국대학교 KU융합과학기술원 교수 연구팀이 가뭄과 한파 등에 따른 식물의 환경재해 저항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ABA(Abscisic acid)의 신호전달 과정을 규명하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식물학 분야의 저명 국제저널인 ‘Molecular Plant(IF=12.08, 분야 상위 1.5 %)’와 2편의 ‘Plant Physiology(IF=6.90, 분야 상위 4.5%)’ 8월호에 동시 발표됐다.
식물이 가뭄과 한파 등을 견디는 환경재해 저항 조절 호르몬인 ABA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 과정에는 수용체(PYL), 탈 인산화효소(ABI), 인산화효소(SnRK) 그리고 전사 조절 인자(ABF)가 관여한다.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에 의하여 식물 세포 내의 ABA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ABA에 결합한 수용체는 인산화효소인 SnRK의 작용을 억제하고 있던 탈 인산화 효소인 ABI를 SnRK로부터 격리하게 되고 그 결과 SnRK는 자가 인산화에 의하여 활성화하게 된다.
이렇게 활성화된 SnRK는 하위에 있는 전사 조절 인자인 ABF를 인산화해 궁극적으로는 식물의 다양한 생체현상에 관여하는 여러 하위 유전자들을 발현시키게 되는데 건국대 윤대진 교수팀은 이러한 신호전달의 전 과정을 규명했다.
윤 교수는 29일 “우리가 사는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현재 전 육지면적의 40%가 사막으로 변하였으며 매년 서울 면적의 6배씩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사막화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식량 생산을 위한 경작지 면적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했고 미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러한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식물생명공학적 연구를 통해 재해 저항성 식물체를 개발하는 것”이라며 “식물은 이동할 수 없지만 변화된 환경을 인식하고 신호전달 반응을 활성화하여 방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재해 저항성 식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이번 연구성과로 식물이 어떻게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인 ABA를 생합성 하는지가 규명되었고 이렇게 생성된 ABA가 세포 내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신호를 생성하고 전달하며 최종적으로 소멸되는가를 분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ABA 생합성과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유용 유전자들에 대한 유전정보들을 이용하게 되면 실용 가능한 수준에서의 재해 저항성 식물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사막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미래 인류가 당면할 식량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