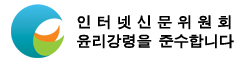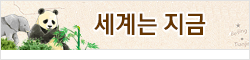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파리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魂).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오세영, 시 ‘그릇’
이번 칼럼에서는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란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 시인은 1942년 전북 전주시 인후동에서 태어났다.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졸업한 후 시인으로 우리문학을 살찌우는데 주력했다.
오 시인의 시 ‘그릇’은 첫 문장부터 매우 강렬한 인상을 준다.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는 파격적인 문장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칼은 무엇이던지 벨 수 있다. 여기에 우리 모두 그릇을 깨트려 다쳐본 경험들이 있다. 이를 비춰볼 때 이 작품의 첫 문장은 매우 강렬하다.
그릇이 깨진다고 하면 보통 문학계에서는 균형이 흐트러진 것으로 해석한다. 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이런 점은 이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여기서는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고 부연했다.
이 시는 코로나 사태에 신음하는 우리사회를 잘 보여주기도 한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란 부분은 지금 사회가 코로나에 ‘살이 베어지고 있음’과 연관된다. 현재 우리는 각자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멀어질 수 있다.
코로나를 극복한 인류를 생각해본다. 칼에 베인 상처가 아물고, 한 층 성숙한 인류의 모습을, 한 층 발달한 의료체계의 모습을 생각해본다. 코로나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다.